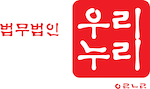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서론
회사는 직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는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때로는 소위 한직으로 발령하거나 팀장이 팀원으로 변경되는 등 사실상 징계성 인사로 느껴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반발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 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자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한계를 정하고 있고(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해당 근로자(혹은 노동조합)와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참조).
가. 업무상 필요성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해당 전직 명령이 업무상 필요가 있느냐입니다.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등 참조).
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에게 전직으로 인해 발생할 불이익이 크지 않은지도 중요합니다.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조건상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가족·사회생활 등 근로조건 외의 불이익도 포함되고, 통근시간의 증가나 급여하락 등 그러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정당한 인사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다. 협의 절차
전직 명령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협의 절차가 부족하다고 하여 전직 명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7.7. 22. 선고 97다18165, 18172 등 참조).
3. 전직명령과 징계 절차
이러한 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은 근로계약에 직무 내용이나 근무지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직무나 근무지를 특정해 두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직 명령은 원칙적으로 징계 처분이 아니지만 만약 회사 규정에 강등이나 전직이 징계의 한 종류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전직명령에 불응하여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징계나 해고를 검토할 수 있지만, 해당 전직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징계 역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하며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그 행사에는 합리성과 정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인사 명령을 내리기 전에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전직으로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 내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